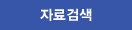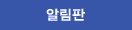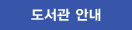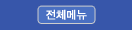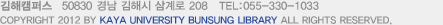자료검색
- 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부가기능
비가 [전자책]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E-Book |
|---|---|
| 개인저자 | 이효석 |
| 서명/저자사항 | 비가[전자책] /이효석 |
| 발행사항 | 서울 : 이북코리아, 2010 : (주)블루마운틴소프트 |
| 형태사항 | 1,862k : 천연색 |
| 요약 | 벌써 얇게 입고 산보할 시절은 아닌 성싶다. 단영은 반시간 동안의 아침 산보에서 돌아오면서 입술이 파랗게 얼고 팔과 무릎이 떨렸다. 손에 꺾어 든 산사나뭇가지의 붉은 열매도 찬 아침공기 속에서는 앙상하고 스산하게 보인다. 산골짝 개울물 소리가 귀에 차고 여러 번 째의 모진 서리를 맞은 단풍잎들도 이제는 벌써 신선한 빛을 잃고 불그칙칙하게 시들어버린 꼴이 시절의 마지막을 고하는 듯도 하다. 푸른빛은 물론 한 곳 찾아볼 데가 없고 붉은 빛도 누른빛도 차차 종적을 감추어 색채 없는 겨울로 들어가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차고 쌀쌀하게 보일 뿐, 온천지의 풍물은 소슬하기 짝없다. 그 산골짝의 온천을 찾은 지 사오 일에 나날이 절기가 달라짐을 느끼며 단영은 추위에 몸이 옴츠러듦을 깨달았다. 서울서도 경의선으로 하루가 걸리는 그 북쪽의 산골을 찾은 것은 하기는 한적한 맛을 구해서가 아니었던가. 쓸쓸한 산속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 마음은 완전히 가라앉고 한 가지의 목적만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었던가. |
| 파일특성 | e-BookXDF |
| 언어 | 한국어 |
| 대출바로가기 | http://ebook.kaya.ac.kr:8080/main/detail.asp?book_num=36B87F38-FCF9-4d31-BAAC-48705C589C98 |
소장정보
- 소장정보
![]() 인쇄
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EE00003014 | 813 이95ㅂ | 가야대학교/전자책서버(컴퓨터서버)/ | 대출가능 |
|
태그
-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