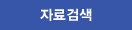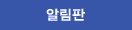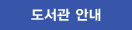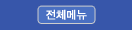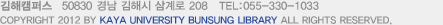자료검색
- 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부가기능
낯선 사람들 : 김영현 장편소설 [전자책]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E-Book |
|---|---|
| 개인저자 | 김영현 |
| 서명/저자사항 | 낯선 사람들 :김영현 장편소설[전자책] /김영현 |
| 발행사항 | 서울 : 실천문학사, 2007 : (주)블루마운틴소프트 |
| 형태사항 | 30,090k : 천연색 |
| ISBN | 9788939205680 |
| 요약 | 끝을 모르는 탐욕과 물신의 현시대를 향해 던지는 도저한 질문! 소설 집필을 마친 후, ‘작가의 말’로 썼던 다음과 같은 장문의 메모는, 이 작품의 진정성 측면에서 다른 어떤 설명보다 진실하다.(그러나 작가는 ‘말’의 ‘덧없음’을 이유로 들며 짧고 간결한 글로 ‘작가의 말’을 대체했다.) “나는 늘 일회적이고 덧없는 생의 너머에 그 무언가, 신이든 별이든, 혹은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진 것이든,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 그것을 헤겔 식으로 이성(reason)이 자기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역사라고 믿기도 했고, 때로는 초월적인 어떤 것, 우주의 심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자유 같은 것을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마치 유리병 속의 나방처럼 결국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언제나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시절, 나는 한때 ‘이성’의 힘을 믿었다. 혹독한 고문과 단식을 하면서도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이성에 대한 믿음조차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깊은 회의에 빠져들었다. 진보는 하나의 허상이며 가나안처럼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회의와 함께 인간은 처음부터 구원, 혹은 완전한 해방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는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차라리 탐욕과 악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훨씬 가까운 어떤 것인지도 몰랐다. 모든 경전은, 성경을 포함하여, 인류가 지닌 탐욕과 피의 기록 이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카인의 낙인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의 이마 위에 찍혀 있는 잠재된 살인 충동의 상징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하여 나는 생각했다. 나의 생은 이 벗어날 수 없는 무의미함과의 대결이었다고. “나의 생은 과연 가치 있는 그 무엇일까?” “나는 과연 이 맹목적인 생의 의지로부터 최소한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불을 찾아갔던 태고의 인류들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별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긴 호흡 끝에 작가 김영현은, 숨이 막힐 듯 광대한 우주의 불가사의 속에서 신의 그림자를 발견한 듯하다. 그리하여 『낯선 사람들』의 순정한 영혼, 성연의 입을 빌려 말해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이 먼지와도 같은 지상이야말로 어쩌면 황량하고 텅 빈 우주 속에서 신이 꿈꾸었던 유일한 천국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리하여 성연의 머리와 어깨를 언제나 한결같은 각도와 온기로 비추어주는 ‘안나’를 통해 지상의 신은 바로 ‘사랑’ 에 다름 아닐 뿐이라고 말이다. |
| 파일특성 | e-BookXDF |
| 언어 | 한국어 |
| 대출바로가기 | http://ebook.kaya.ac.kr:8080/main/detail.asp?book_num=2FA513BD-01BC-4f03-9BFB-81D6FB6987AC |
소장정보
- 소장정보
![]() 인쇄
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EE00003278 | 813 김64ㄴ | 가야대학교/전자책서버(컴퓨터서버)/ | 대출가능 |
|
태그
-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