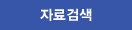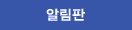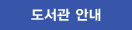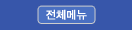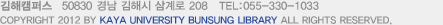자료검색
- 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부가기능
바늘구멍에 대한 기억 [전자책]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E-Book |
|---|---|
| 개인저자 | 김형식 |
| 서명/저자사항 | 바늘구멍에 대한 기억[전자책] /김형식 |
| 발행사항 | 서울 : 삶이보이는창, 2006 : (주)블루마운틴소프트 |
| 형태사항 | 5,714k : 천연색 |
| ISBN | 8990492351 |
| 요약 | 시집 전체에는 소멸과 부재를 향한 ‘폐허의 세계’와 생성을 향해 열린 ‘신생의 세계’가 교직되어 있다. 시인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세계가 사실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폐허와 소멸에서 생명과 신생으로 나아간다. 불볕의 골목 끝 등나무 아래/ 무릎에 아이들 눕혀 놓고 속옷차림 늙은 여자 몇/ 성긴 부채질로 다문다문 옛 시간을 돋우고 있다// 스스르 잠든 아이 하나/ 잠결에 허기졌는지 빈 입 다시다/ 젖무덤 헤쳐 늙은 시간 오물거리는데// 천연덕 드러났던 쭈그렁 젖퉁이/ 되려 아이의 물오름 빨아들이는 꽃망울처럼/ 조금씩, 어느 사이 불그스레 봉긋 솟는다 ―「늙은 여자가 있던 자리」일부 위 시의 시적 대상인 “늙은 여자”들은 이른바 생산성이 거세된 여성들이다. 특히 그녀들은 현재와 미래보다 “옛 시간” 또는 “늙은 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존재들이다. 하지만 “한 아이”가 늙고 쭈그러진 “젖무덤”을 “오물거리”며 “빨아들이는” 순간, 놀랍게도 “쭈그렁 젖퉁이”가 “불그스레 봉긋 솟는다”. 그저 지나치기 십상인 늙고 폐허화된 죽음과 소멸의 시간에서 “꽃망울” 같은 생명과 신생의 힘이 현현한다. 이렇듯 김형식의 시 속에서 소멸의식은 “무상”(「경계」)이나 “정지된 허공”(「2001 민중대회 후기」)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멸과 폐기의 시공간 속에서 계속 유지되고 보존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일견 낡고 뒤처진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폐기처분하거나 청산해가는 것이 마치 진보인 양 치부되거나 위장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때 몸 뜨거웠을 탄(炭)재들”과 같은 “폐허”(「구절초」)의 시간 속으로 되돌아 간 것들에 생명력을 부여하려는 의지와 맞물려 있다. |
| 파일특성 | e-BookXDF |
| 언어 | 한국어 |
| 대출바로가기 | http://ebook.kaya.ac.kr:8080/main/detail.asp?book_num=AC7C9909-BC7C-4ed2-AE02-6BF52578221C |
소장정보
- 소장정보
![]() 인쇄
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EE00003115 | 811 김94ㅂ | 가야대학교/전자책서버(컴퓨터서버)/ | 대출가능 |
|
태그
-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