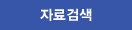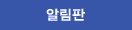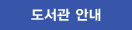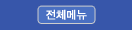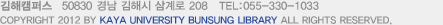자료검색
- 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부가기능
토끼 이야기 [전자책]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E-Book |
|---|---|
| 개인저자 | 이태준 |
| 서명/저자사항 | 토끼 이야기[전자책] /이태준 |
| 발행사항 | 서울 : 이북코리아, 2010 : (주)블루마운틴소프트 |
| 형태사항 | 1,621k : 천연색 |
| 요약 | 현은 잠이 깨자 눈을 부비기 전에 먼저 머리맡부터 더듬었다. 사기대접에서 밤샌 숭늉은 얼음에 채운 맥주보다 오히려 차고 단 듯하였다. 문득 전에 서해(曙海)가, 이제 현도 술이 좀 늘어야 물맛을 알지 하던 생각이 난다. ‘지금껏 서해가 살았던들, 술맛, 물맛을 같이 한번 즐겨볼 것을! 그가 간 지도 벌써 십 년이 넘는구나!’ 현은 사지를 쭈욱 뻗어 기지개를 켜고 파리 나는 천당을 멀거니 쳐다본다. 중외(中外) 때다. 월급날이면, 그것도 어두워서야 영업국에서 긁어오는 돈 백 원 남짓한 것을 겨우 삼 원씩, 오 원씩 나눠 들고 그거나마 인력거를 불러 타고 호로를 내리고 나서기 전에는, 문 밖에 진을 치고선 빵장수, 쌀장수, 양복점원 들에게 털리고 말던 그 시절이었다. 현은 다행히 독신이던 덕으로 이태나 견디었지만, 어머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과 더불어 남의 셋방살이를 하던 서해로서는, 다만 우정과 의리를 배불리는 것만으로 가족들의 목숨까지를 지탱시켜 나갈 수는 없었다. “난 매신으로 가겠소. 가끔 원고나 보내우. 현도 아무리 독신이지만 하숙빈 내야 살지 않소.” 현은 그 후 ‘중외’에 있으면서 실상 ‘매신’의 원고료로 하숙집 마누라의 입을 겨우 틀어막곤 하였다. 그러다 ‘중외’가 기어이 폐간이 되자 현은 그까짓 공연히 시간만 빼앗기던 것, 이젠 정말 내 공부나 착실히 하리라 하고, 서해가 쓰라는 대로 잡문을 쓰고 단편도 얽어 하숙비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 때에 맛 모르고 읽은 태서대가(泰西大家)들의 명작들을 재독하는 것부터 일과를 삼았었다. 그러나 사람은 조금만 틈이 생기어도 더 큰 욕망에 눈이 텄다. 공연히 남까지 데려다 고생을 시켜? 하는 반성이 한두 번 아니었으나 결국 직업도 없이, 집 한 간 없이, 현은 허턱 장가를 들어 놓았다. 제 한 몸 이상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확실히 제 한 몸 전신으로 힘을 써야 할 짐이었다. 공부고 예술이고 모두 제이 제삼이 되어 버렸다. |
| 파일특성 | e-BookXDF |
| 언어 | 한국어 |
| 대출바로가기 | http://ebook.kaya.ac.kr:8080/main/detail.asp?book_num=34703087-6BA3-4b0d-93BD-1DB7C7166450 |
소장정보
- 소장정보
![]() 인쇄
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EE00003090 | 813 이88ㅌ | 가야대학교/전자책서버(컴퓨터서버)/ | 대출가능 |
|
태그
-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