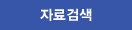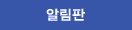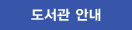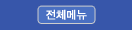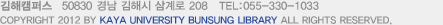자료검색
- 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부가기능
장미 병들다 [전자책]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E-Book |
|---|---|
| 개인저자 | 이효석 |
| 서명/저자사항 | 장미 병들다[전자책] /이효석 |
| 발행사항 | 서울 : 이북코리아, 2010 : (주)블루마운틴소프트 |
| 형태사항 | 2,657k : 천연색 |
| 요약 | 싸움이라는 것을 허다하게 보아 왔으나 그렇게도 짧고 어처구니 없고―-그러면서도 싸움의 진리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은 드물었다. 받고 차고 찢고 고함치고 욕하고 발악하다가 나중에는 피차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그런 싸움이 아니라 맞고 넘어지고 항복하고―-그뿐이었다. 처음도 뒤도 없이 깨끗하고 선명하여서 마치 긴 이야기의 앞뒤를 잘라 버린 필름의 몇 토막과도 같이 신선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그 신선한 인상이 마치 영화관을 나와 그 길을 지나던 현보와 남죽 두 사람의 발을 문득 머무르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람들 속에 한몫 끼여 섰을 때에는 싸움은 벌써 끝물이었다. 영화관, 음식점, 카페, 매약점 등이 어수선하게 즐비하여 있는 뒷거리 저녁때, 바로 주렴을 드리운 식당 문앞이었다. 그 식당의 쿡으로 보이는 흰 옷에 흰 주발모자를 얹은 두 사람의 싸움이었으나 한 사람은 육중한 장골이요, 한 사람은 까무잡잡한 약질이어서, 하기는 그 체질에 벌써 승패가 달렸던지도 모른다. 대체 무엇이 싸움의 원인이며 원한의 근거였는지는 모르나 하루아침에 문득 생긴 분김이 아니요, 오래 두고두고 엉겼던 불만의 화풀이임은 두 사람의 태도로써 족히 추측할 수 있었다. |
| 파일특성 | e-BookXDF |
| 언어 | 한국어 |
| 대출바로가기 | http://ebook.kaya.ac.kr:8080/main/detail.asp?book_num=5C45A940-72CF-4889-A1E3-02CF1DEE1C37 |
소장정보
- 소장정보
![]() 인쇄
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EE00003068 | 813 이95ㅈ | 가야대학교/전자책서버(컴퓨터서버)/ | 대출가능 |
|
태그
-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