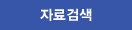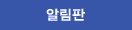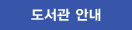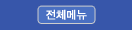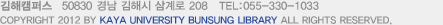자료검색
- 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부가기능
장마 [전자책]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E-Book |
|---|---|
| 개인저자 | 이태준 |
| 서명/저자사항 | 장마[전자책] /이태준 |
| 발행사항 | 서울 : 이북코리아, 2010 : (주)블루마운틴소프트 |
| 형태사항 | 2,448k : 천연색 |
| 요약 | “가만히 눴느니 반침이나 좀 열어 보구려.” “건 또 무슨 소리야?” “책이 모두 썩어두 몰루?” 하고 아내는 몰래 감추어 두고 쓰는 전기다리미 줄을 내다가 곰팡을 턴다. “책두 본 사람이 좀 내다 그렇게 털구려.” “일도 없어 그런 거꺼정 하겠군! 좀 당신 건 당신이 해 봐요. 또 남 보구만 그런 것두 못 보구 집에서 뭘 했냐 마냐 하지 말구……” “쉬― 고만둡시다. 말이 길면 또 엊저녁처럼 돼.” 하고 나는 마룻바닥에서 일어나 등의자로 올라앉았다. 등의자도 삶아 낸 것처럼 눅눅하다. 적삼 고름으로 파놓은 데를 쓱 문대겨 보니 송충이나 꿰트린 것처럼 곰팡이와 때가 시퍼렇고 시커멓게 묻어난다. 나는 그제야 오늘 아침에 새로 입은 적삼인 것을 깨닫고 얼른 고름을 감추며 아내를 보았다. 아내는 아직 전기다리미 줄만 마른 행주로 훔치고 있었다. 보았으면 으레 “어린애유? 남 기껀 빨아 대려 입혀 놓니까……” 하고, 한마디 혹은 내가 가만히 듣고 있지 않고 맞받으면 열 마디 스무 마디라도 나왔을 것이다. 늙은 내외처럼 흥흥거리기만 하고 지내는 것은 벌써 인생으로서 피곤을 느낀 뒤이다. 젊은 우리는 가끔가다 한 번씩 오금을 박으며 꼬집어 떼듯이 말총을 쏘고 받는 것도 다음 시간부터의 새 공기를 위해서는 미상불 필요한 청량제이기도 하다. |
| 파일특성 | e-BookXDF |
| 언어 | 한국어 |
| 대출바로가기 | http://ebook.kaya.ac.kr:8080/main/detail.asp?book_num=F001C4F1-07A7-439d-84F2-26ABFE26094E |
소장정보
- 소장정보
![]() 인쇄
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EE00003067 | 813 이88ㅈ | 가야대학교/전자책서버(컴퓨터서버)/ | 대출가능 |
|
태그
-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