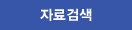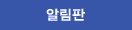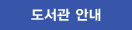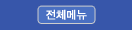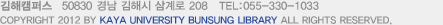자료검색
- 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부가기능
은은한 빛 [전자책]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E-Book |
|---|---|
| 개인저자 | 이효석 |
| 서명/저자사항 | 은은한 빛[전자책] /이효석 |
| 발행사항 | 서울 : 이북코리아, 2010 : (주)블루마운틴소프트 |
| 형태사항 | 2,658k : 천연색 |
| 요약 | 먼지 냄새라는 걸 처음 만아 보기나 하듯 욱(郁)은 진열장을 만지작거리고는, 거매진 손가락을 코끝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비좁고 퀴퀴한 가게방 가득한 고물(古物)들 위에 훔치고 닦고 하는 동안에 어느 틈엔가 먼지는 쌓이고 쌓여,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를 주장하기나 하는 것 같았다. 낙랑(樂浪)과 고구려를 주로 하여 고려, 이조시대 것을 합쳐서 오백 점은 착실히 되는 도자기 이외에, 수백 장의 기와 등속이 줄줄이 늘어선 장속에 그득히 진열되어 있었다. 흙 속에서 주워낸 이들 고대의 정물(靜物)은 제각각 예대로의 의지를 지닌 듯, 욱은 며칠이고 시골을 나가 돌다가 가게방으로 돌아오면 조용한 벽 속에 영혼의 숨소리를 듣는 것만 같아서 먼지 냄새가 유난히 다정스러웠다. 진열창으로 오후의 희미한 햇빛이 들이비치고 봉당에는 희푸른 그늘이 퍼져 있다. 가게방은 바로 좁은 행길을 면하고, 만주 호두나무 가로수가 그 나무 그늘 속에 가게방을 몽땅 싸 덮고 있어서 봉당은 언제나 어둑하게 그늘져 있었다. 밤새 내린 비로 나무는 거의 이파리를 떨치고, 병원이니 가구점이니 과물전이니 다닥다닥 들어앉은 골목 안에 가득히 낙엽을 퍼뜨려, 그 언저리 물구덩이고 우리창께고 할 것 없이 주책없이 몰아치고는 소조한 계절감을 더욱 짙게 하고 있었다. |
| 파일특성 | e-BookXDF |
| 언어 | 한국어 |
| 대출바로가기 | http://ebook.kaya.ac.kr:8080/main/detail.asp?book_num=F89D1D92-1DE3-40e8-82BD-554034F37EFD |
소장정보
- 소장정보
![]() 인쇄
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EE00003056 | 813 이95ㅇ | 가야대학교/전자책서버(컴퓨터서버)/ | 대출가능 |
|
태그
-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