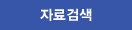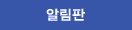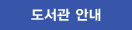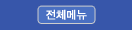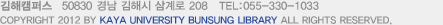자료검색
- 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부가기능
왕자 호동 [전자책]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E-Book |
|---|---|
| 개인저자 | 이태준 |
| 서명/저자사항 | 왕자 호동[전자책] /이태준 |
| 발행사항 | 서울 : 이북코리아, 2010 : (주)블루마운틴소프트 |
| 형태사항 | 29,057k : 천연색 |
| 요약 | 압록강(鴨綠江)의 상류로부터 그 중류 일대를 중심으로 하고 조선과 만주에 허리를 걸치고 있던 그때의 고구려는 어느 한쪽에도 시원히 트인 바다는 없었다. 육지만으로 둘린 나라였다. 육지라도 그냥 비인 따가 아니라 모두가 이빨 날카로운 야수와 가치 창과 화살로 겨누고 섰는 적국들의 국경이었다. 북으로 부여(扶餘)와 읍루(?婁)가 사나웠고, 동으로 옥저(沃沮)와 예맥(濊貊)이 시기하기 시작하였고 서와 남으로는 한(漢)나라 본국의 세력과 아울러 그의 한 고을(郡)로서 왕검성(王儉城=平壤附近)에 근거를 둔 낙랑(樂浪)이 틈만 있으면 덥치려 하였다. 사방 적으로 포위된 것이 그때의 고구려였다. 먹느냐, 먹히느냐, 둘 중의 하나가 늘 고구려의 절박한 운명이었음으로 시조 동명왕(東明王)이 흘승골(紇升骨)에 궁성을 이룩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강토를 마련하던 십팔 년 동안 하루도 허리에서 칼을 끄른 날이 없었고, 다음 임금 유리왕(瑠璃王)도 재위 삼십육 년 간, 변방에서 말굽소리 일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다. |
| 파일특성 | e-BookXDF |
| 언어 | 한국어 |
| 대출바로가기 | http://ebook.kaya.ac.kr:8080/main/detail.asp?book_num=BA377584-E25C-4337-9417-7D716FFEC2CB |
소장정보
- 소장정보
![]() 인쇄
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EE00003050 | 813 이88ㅇ | 가야대학교/전자책서버(컴퓨터서버)/ | 대출가능 |
|
태그
-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