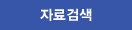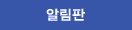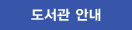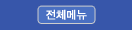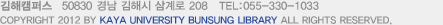자료검색
- 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부가기능
여인전기 [전자책]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E-Book |
|---|---|
| 개인저자 | 채만식 |
| 서명/저자사항 | 여인전기[전자책] /채만식 |
| 발행사항 | 서울 : 이북코리아, 2010 : (주)블루마운틴소프트 |
| 형태사항 | 18,772k : 천연색 |
| 요약 | 칠팔월 노양이라니, 추석머리의 한낮 겨운 햇볕이 여름처럼 따갑다. 하늘은 바야흐로 제철을 맞이하였노라 훨씬 높고 푸르렀고. 논이란 논마다 무긋무긋 숙어가는 벼이삭이 아직도 따갑고 살진 태양의 열과 광선(紫外線)을 마음껏 받으면서 마지막 여물이 여물기에 소리 없이 한창 바빠 있다. 잘 새끼 친 소담스런 포기들, 수수목 만씩한 굵고 탐진 이삭들……향교동(鄕校洞) 넓은 고래실은 올도 풍년이다. 논 두둑으로는 새막이 드뭇듬성 불규칙하게 가다오다 하나씩 서 있다. 벼는 뜨물 때가 지났고, 어린아이와 늙은이의 손까지 농촌은 아쉰 시절이라 새막이 태반은 다 비었다. 큰 마을(本洞) 바로 앞 신작로 건너로 거기에도 새막이 하나. 여학생 태의 나이는 한 이십이나 되었을까, 남색 몸빼 입고 같은 남색조끼를 하얀 머플러에다 받쳐 입고 납작 구두 신고, 이렇게 썩 도회지적으로 말쑥이 때가 벗은, 그래서 논 두둑이니 새막이니의 흙 내 나고 촌스런 풍물과는 자못 어울리지 않는 영양이 그러나, 그런 부조화는 내 모른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새막 가에 가 발을 대롱거리며 걸터앉아서 새 보는 시늉을 하고 있다. 문주(紋珠)가 고향엘 온 것이었다. |
| 파일특성 | e-BookXDF |
| 언어 | 한국어 |
| 대출바로가기 | http://ebook.kaya.ac.kr:8080/main/detail.asp?book_num=73C8DC79-6AD8-4f83-91EB-ABB8B0CF9063 |
소장정보
- 소장정보
![]() 인쇄
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EE00003048 | 813 채32ㅇ | 가야대학교/전자책서버(컴퓨터서버)/ | 대출가능 |
|
태그
- 태그